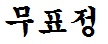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갔답니다;
이름하여 '준용하천 운곡천;'..
여름이 되면 물장구도 자주 쳤고
몇 해에 한번씩 누군가 소에 빠져죽기도 하던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냇가였지요.
할아버진 낚시를 참 좋아하셨죠.
매일 새벽무렵이나 해질녘이면
항상 낚시대를 들고 개울가로 향하셨지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낚시는 이른바 파리낚시였어요.
공식명칭은 계류낚시나 피라미낚시 정도가 맞겠군요.
파리나 모기모양의 터럭과 겹눈처럼 반짝이는 플라스틱이 달린 낚시바늘로
배고픈 물고기들을 잡아내는 낚시 말이죠.
저는 게으름이 많아 새벽낚시는 따라가진 못했지만
저녁무렵에는 할아버지를 따라 대나무 낚시대를 들고
논길을 구불구불 지나 강둑의 풀숲을 헤집어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일이 어찌나 즐거웠던지 모릅니다.
어린 제겐 낚시대를 드는 일도 버거웠고
물 안으로 들어가 계속 서있어야 하는 일도 고역이었기에
할아버지가 잡아주신 물고기들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일들이 낙이었던 것 같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같이 간지 좔좔 흐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보기 좋았어요.
해질무렵 석양으로 반짝이는 개울 가운데에서
여울진 강물 위에 번쩍이는 은빛 낚싯줄을 던지는 어떤 촌로의 모습은 말이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낚시대는 한동안 주인을 잃고 있었지요.
할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우게 된건 초등학교 5학년때 쯤이 아닌가 싶어요.
동네의 또래들과 어항 놓고 반두질 하며 고기잡던 것과는 다른 체험이었죠.
지금도 저는 저수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찌만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것이 무척이나 답답스럽기도 했거니와
두 발을 강물에 담그고 내 손으로 낚시줄을 풀었다 당겼다 하는
흐르는 물소리 가운데서 느끼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물고기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늦은 오후의 여울은
파리낚시를 하기는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입니다.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개울로 조심조심 걸어들어가
은빛 낚싯줄을 휘휘 돌려 여울진 강심으로 던져넣고
맨 끝에 달린 낚시바늘의 흐름을 지긋이 바라봅니다.
물의 흐름에 낚싯줄이 충분히 풀린 것을 확인하면
천천히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며 낚싯대를 당겨봅니다.
어느새 눈썰미 밝은 피라미떼가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성질 급한 녀석은 바늘을 건드려 낚시대의 떨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잡아채는건 금물이죠.
물고기들의 움직임과 낚시바늘의 흐름을 주시하며
이제부터 감에 의지해서 낚시줄을 끌고 당길 시간입니다.
낚시줄을 천천히 풀어주었다가 때로는 천천히 당겨
그들을 강 주변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재빠르게 당겨 그들의 입 안에 낚시바늘을 박아넣기도 합니다.
낚시대를 풀어주다 갑자기 챌때 푸드득 하고 떨려오는 낚시대의 전율과
강 아랫쪽에서 첨벙대며 힘껏 낚시줄에 저항하는 피라미를 바라보며
서서히 손맛을 즐기며 끌어올리는 순간이란..
물론 바다낚시나 저수지 붕어낚시에 비하면
혹은 송어나 가물치 같은 힘좋은 민물고기낚시에 대자면
피라미는 손맛이라고 하기에도 미흡한 수준이지만
낚싯대와 뜰채의 단촐한 준비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이 피라미낚시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귓가로 들려오는 물소리에 어느새 잡념은 사라지고
강의 흐름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향하며 낚시바늘을 던지곤 하던 기억은
밧데리질;이나 생석회;뿌려 고기잡는 무식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망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언젠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잡아온 물고기들로 끓여낸 얼큰한 매운탕에다
소주한잔을 걸치며 두런두런 정담을 나누고 싶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언젠가는 다가올 법도 한
작은 즐거움에 대한 기대 정도로 남겨두고 싶네요.